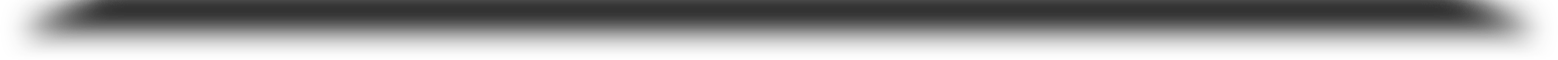영원한 사랑 5
“애는 잘 커?”
“네..엄마가 잘 봐주시니 까요....그런데...애가 할머니를 엄마로 알까봐 그게 걱정이예요”
“일주일에 몇 번 애를 봐?”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어맛....”
희은이 걸음을 옮기다 발목이 삐어 휘청거렸다. 하이힐이 보도블럭 틈 사이에 빠진 것 같았다.
“발 삐었나 보내....”
“아파라...”
그녀가 자세를 바로하고 몇 걸음 걷다가 멈췄다. 아무래도 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팔짱 껴”
“네?”
희은이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곁에 서자 팔을 조금 벌려주자 그녀가 팔짱을 꼈다.
뭉클한 가슴의 감촉이 팔에 느껴졌다.
왠지 술이 확 달아나는 기분에 기묘한 흥분을 느꼈다.
이렇게 가까이 있어본 게 몇 년 만인지...
“옛날 생각나내”
“옛날요?”
“응...희은이하고 등산가고...테니스치고...드라이브가고 그랬잖아”
“아..맞아요...나 그때 경훈씨 참 좋아했는데”
“뭐?”
갑자기 튀어나온 그녀의 말에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자 희은은 오히려 내게 반문했다.
“뭐예요? 그 표정...설마 몰랐어요?”
경훈은 어지러웠다. 머릿속이 엉망으로 뒤엉켰다.
‘뭐야....이 말은....날 좋아했단 거야?’
‘왜 모르고 있었지?’
‘왜 몰랐던 거지?’
‘알았다면...알았다면......제길........’
“정말이네...몰랐군요...어쩜 그렇게 둔할 수가....”
“아니...난...그게......”
당황하여 말까지 더듬는 경훈이었다. 그 모습에 희은이 발그레 웃었다.
“회사 처음 들어가서 도움 받고,,또 함께 다닌 시간이 얼마인데...설마 싫어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붙어 있을 거라 생각하면 바보 아니예요?”
이제 희은은 놀리기까지 했다.
‘이...이게...대체 뭐야....내가....난.....하아......그랬구나...그랬어......’
희은은 팔짱을 풀지 않고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 했다.
“그런데 좋아하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조신한 내가 먼저 고백하긴 그렇고, 고민고민 하는 사이 다른 남자가 생긴 거죠”
“그...그랬어?”
‘아냐...나도 널 좋아했어...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서...그런 건데....’
“화가 났죠...좋아하는 남자는 알아차리지도 못하고....그러는 사이 먼저 간 신랑하고 좋아하게 된거죠....”
문득, 경훈은 이 길이 영원히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 번 끊어졌던 인연이다. 그 것이 다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미망인이어도 상관없다.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오직 행복하기만을 빌었다.
그랬기에 36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았다.
떨치려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다른 여자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바보였네....”
“이제 아셨어요?...정말 바보라니까....”
“맞아...그 바보는 그 때도 널 사랑했고....그 후에도 사랑했고...”
희은이 어느새 경훈의 옆 모습을 보며 걸었다.
“지금도 사랑하지....현재 진행형이야....그건 끝이 없는 레일을 달리는 기차 같은 거지”
마침내 희은이 걸음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왜..그 때는.....말하지.....않았죠?”
어느새 그녀의 음색이 갈라져 있어 가슴속의 흔들림을 내비쳤다.
“그래서 바보지..”
“지금..경훈씨..얼마나 비겁한지 아세요?”
희은이 싸늘하게 말을 되받았다.
“.......”
“그 말이 절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아세요?. 남편을 보낸 지 2년이예요....이제 겨우 상처에서 벗어나려는데.....왜......왜......그런 말을....이제야......흑......흑......”
희은이 경훈의 옷깃을 잡고 흐느꼈다. 주위를 지나던 행인들이 그 모습에 수군거렸다.
“예전에 못했던 말.....지금 한 거야....그게 비겁한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내 잘못이야...미안해”
“흑.....흑......”
그녀가 결국 경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다. 가슴 앞섶을 다 적실 것 같았다.
밤하늘 어느새 몰려온 먹장구름은 달을 가리고
함박눈을 떨어뜨렸다.
두 사람은 어깨에 눈이 수북히 쌓일 때까지 오랫도록 그 곳에 머물렀다